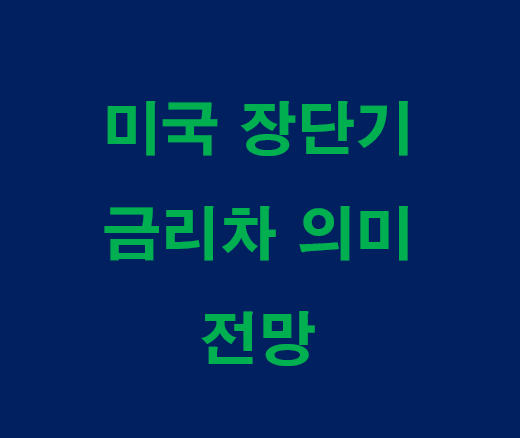
요즘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는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기때문입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니다.
1. 장단기금리차 역전의 의미
아래 그래프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서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를 뺀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2019년 9월에 마지막으로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 3월 30일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장단기금리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채권마다 만기가 다 다른데,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보면, 1년 동안 빌려주는 것보단 10년 동안 빌려주는 것이 위험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기가 짧은 채권, 단기금리가 더 낮고 만기가 긴 채권, 장기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이로 인한 역전현상은 단기채권의 금리가 장기채권의 금리보다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볼께요. 이유는 단기금리가 높아지거나, 장기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ㅎㅎ.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높아지고 장기금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낮아진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기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와 직결된 단기 채권의 금리부터 영향을 받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기, 장기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그럴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 단기채권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채의 금리가 미처 올라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평상시에는 채권의 기간에 따른 이자율 그래프, 채권수익률곡선(Yield Curve)이 아래의 파란색 곡선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곡선이 평평해지다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빨간색 곡선처럼 나타나게 돼요. 파란색을 커브 플래트닝(Flattening), 빨간색을 커브 스티프닝(Steepening)이라고 부릅니다.

장기금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도 낮아지기도 합니다.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채권금리는 내려가는 채권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가격이 올라갑니다.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채권금리(실질이자율)는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빌려주고 100원의 이자를 주기로 한 채권은 금리(이자율)가 10%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채권가격이 20,000원으로 올랐다면, 금리(이자율)는 5%가 됩니다. 채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금리는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권가격을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주식보다는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채권가격이 오르는 됩니다. 장기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예를 들어 10년물의 금리가 낮아진다면 사람들이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불안한 미래에 채권을 사기 시작하면서 채권가격은 올라가지만 채권금리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경기후퇴일까요?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통상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여겨집니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뜻하는 ‘빅스텝’이 확실히 되고 있는가운데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현지 시각) 오후 한때 뉴욕 채권 시장에서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둘 다 연 2.39%대에서 혼조세를 보이다 2년물 금리가 미세하게 더 높은 현상이 수초간 이어졌습니다. 2년물 금리가 10년물을 앞지른 건 미중 무역분쟁이 빚어졌던 2019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통상 금융 시장에서 금리 역전 현상의 바로미터로 삼는 채권이 2년물과 10년물인데, 10년물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대표적인 시장 금리입니다. 2년물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8일 미 국채 5년물 금리는 2.66%로 30년물 금리(2.64%)를 앞질렀던 적이 있어요. 5년물 금리가 30년물 금리를 웃돈 것도 2006년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3월 초에도 5년물과 10년물 금리 간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지요.
■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 신호인가?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하강의 전조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리 전문가인 캠벨 하비 듀크대 교수 분석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7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 그 후 5~23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경기 불황의 전조로만 보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유로는,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장단기 채권 간 금리가 엇갈리는 현상이 있어요. 금융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의 벤치마크로 삼는 지표는 2년물과 10년물 간 스프레드(금리 격차)다. 이 격차가 좁혀지면 금융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러나 최근 금융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는 또 다른 지표는 3개월과 10년물 스프레드입니다. 미 연준의 다수 보고서에서 이 지표가 미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3개월과 10년물 스프레드를 함께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수익률 스프레드를 선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 연준 역시 지난 3월 25일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전조는 2년 미만의 단기 국채 사이 금리 격차에서 더 잘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최근 3개월과 10년물 금리 격차는 더 벌어져 투자자 사이에 진짜 경기 침체가 임박했는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10년물 금리는 2.55%로, 201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난 2년 동안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폈던 연준의 채권 매입이 중단(채권 수요 감소)되면서 10년물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최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장기 금리가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내려앉은것이 아니라 단기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빚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패턴은 대부분 장기 금리 곡선이 추락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때 투자자들이 단기채 투자를 꺼려 단기채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던 중 장기채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금리 역전 패턴이 빚어지는거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과 실물경제 간 상관관계가 약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경기침제를 예단하고 ‘손절’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앉을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989년 장단기 수익률(금리) 곡선 역전 이후 1990년 중반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가는 이전보다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2005년 말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을 때도 주식에서 안전자산으로 갈아탔던 투자자들은 S&P500지수가 25% 이상 더 올랐으니까요.
거시경제 지표도 아직 추세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미 연준의 경기 침체 확률 지표는 6.1%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기준선(30%)을 크게 밑돌았고 경기 모멘텀을 대변하는 경기 서프라이즈지수(ESI)도 선진, 신흥 주요국 모두 아직 우상향 추세입니다.
3. 장단기금차의 역전에 대한 대응방법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되고 몇십 년간 묵혀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지속적인 투자를 하시는게 좋아요. 그러나 조정을 기회로 보고 평소보다 많이 투자했다면, 이제는 리스크를 조금 헤지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적립식 투자자들처럼 적립금액을 하락장 이전처럼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한 헤지이지 않을까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결국은 올라간 금리에 맞춰서 경제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가와 자산 가치는 우상향 할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를 안정화하려는 움직임이지 경제를 세우려는 건 아니니까요.